역문협
ㆍ
2024.11.15
0
ㆍ
조회
14
| 지역:
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 약산
| 시대:
고려~조선시대
| 유형:
사찰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역문협
ㆍ
2024.11.15
0
ㆍ
조회
18
| 지역:
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
| 시대:
조선시대(1727년)
| 유형:
누정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역문협
ㆍ
2024.10.17
0
ㆍ
조회
56
| 지역:
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
| 시대:
조선시대
| 유형:
사찰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역문협
ㆍ
2024.10.15
0
ㆍ
조회
64
| 지역:
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
| 시대:
고구려 / 고려 / 조선
| 유형:
성곽유적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역문협
ㆍ
2024.09.20
0
ㆍ
조회
170
| 지역:
평안북도 구성시 성안동
| 시대:
고려시대
| 유형:
성곽유적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역문협
ㆍ
2024.08.21
0
ㆍ
조회
180
| 지역:
평안남도 평원군 평원읍
| 시대:
조선시대(17세기)
| 유형:
누정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역문협
ㆍ
2024.08.21
0
ㆍ
조회
172
| 지역:
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
| 시대:
고구려(6세기)
| 유형:
벽화무덤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역문협
ㆍ
2024.07.17
0
ㆍ
조회
238
| 지역:
평안남도 성천군 성천읍
| 시대:
조선시대
| 유형:
객사 터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역문협
ㆍ
2024.07.17
0
ㆍ
조회
239
| 지역:
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
| 시대:
조선시대
| 유형:
절
| 종목:
국보
역문협
ㆍ
2024.06.21
0
ㆍ
조회
295
| 지역:
평안남도 안주시 청천강동
| 시대:
고구려, 조선시대
| 유형:
성곽유적
| 종목:
국보문화유적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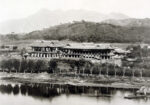


Social Link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