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문협
ㆍ
2023.04.14
0
ㆍ
조회
324
| 지역:
개성시 선죽동
| 시대:
조선시대
| 유형:
서원
| 종목:
국보문화유물
역문협
ㆍ
2023.04.14
0
ㆍ
조회
323
| 지역:
함경북도 김책시
| 시대:
조선시대
| 유형:
비석
| 종목:
국보문화유물
역문협
ㆍ
2023.04.14
0
ㆍ
조회
350
| 지역:
량강도 천지연시 백두산지구
| 시대:
조선시대
| 유형:
재단
| 종목:
역문협
ㆍ
2022.11.02
0
ㆍ
조회
641
| 지역:
라선시 라진구역 해양동 초도
| 시대:
청동기시대
| 유형:
발굴유물
| 종목:
역문협
ㆍ
2022.10.20
0
ㆍ
조회
826
| 지역:
개성시 룡흥동
| 시대:
고려시대
| 유형:
사찰
| 종목:
국보문화유물
역문협
ㆍ
2022.09.29
0
ㆍ
조회
910
| 지역:
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
| 시대:
삼국시대(고구려)
| 유형:
사찰
| 종목:
국보문화유물
역문협
ㆍ
2021.03.19
1
ㆍ
조회
1436
| 지역:
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1동
| 시대:
고구려
| 유형:
당간지주
| 종목:
국보문화유물
역문협
ㆍ
2021.03.19
0
ㆍ
조회
1531
| 지역:
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
| 시대:
고구려
| 유형:
연못
| 종목:
일반유적유물
역문협
ㆍ
2021.03.19
1
ㆍ
조회
1121
| 지역:
평양시 룡성구역 청계동
| 시대:
고구려
| 유형:
무덤
| 종목:
역문협
ㆍ
2021.03.19
1
ㆍ
조회
1076
| 지역:
평양시 룡성구역 청계동
| 시대:
고구려
| 유형:
무덤
| 종목:
일반유적유물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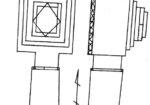

Social Links